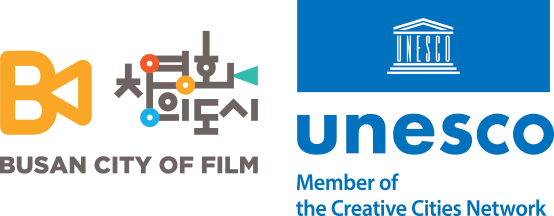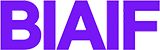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오래된 극장 <플레이어>2020-01-06
-

<플레이어> : 타고난 허물과 이단아의 덕목
김영광(부산영화평론가협회)
로버트 알트만의 <플레이어>(1992)는 할리우드의 제작시스템을 풍자하는 대표 격의 영화다. 좀 된다 싶으면 속편과 아류작을 만들고, 연기연출보다 스타 배우를 고집하며, 이제 흥행의 꿈만 남았을 뿐 작가(감독)의 예술성은 말살하는 '꿈의 공장'. <플레이어>는 “모든 작가의 이름”으로 할리우드 제작자에게 복수를 예고하는 서사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일찌감치 죽는 쪽은 작가이다. 작가를 살해한 제작자는 죽은 작가의 애인과 해피엔딩을 맞는다. 그것도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겠다는 뻔뻔한 꿈을 꾸며 말이다. 따로 부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차 없는 블랙코미디가 <플레이어>다.
그런데 2006년에 타계한 알트만에 관한 다큐멘터리 <감독 알트만>(2014)에는 새겨들을만한 부연이 있다. “알트만 감독님, <플레이어>는 할리우드에 대한 복수입니까?” 알트만은 답한다. “아니요. 아주, 아주 가벼운 기소입니다(very, very mild indictment).” 할리우드가 오랫동안 경원시한 그로서나, <플레이어>가 할리우드의 엉덩이를 걷어찼다는 세간의 평가를 떠올리면 다소 의외다. 알트만은 부연한다. “상황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알트만의 부연은 이상하게 머릿속을 맴돈다. <플레이어>에 등장하는 상황이 실제 할리우드와 거리가 있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아마 이 거리는 영화 매체가 지니는 허구성을 지적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할리우드의 이단아로 불린 알트만의 대표작이 허상이라는 고백도 아닐 것이다. <플레이어>의 풍자극은 그야말로 신랄하다. 씁쓸한 결말을 가진 블랙코미디지만 보는 쪽에선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크리티컬하다. 왠지 가벼운 기소라는 알트만의 부연은 조금 까다로운, 실제 묘사의 불필요에 관한 까다로운 거리를 말하는 듯하다.
<플레이어>는 생각보다 설명하기 까다로운 영화다. 할리우드의 제작시스템을 기소하는 것은 자명해 보이지만, 기소의 방식으로 차용 및 인용, 카메라의 거리와 자세(엿보기와 엿듣기)도 쓰기 때문이다. 오손 웰즈의 <악의 손길>(1958)을 차용하는 오프닝 씬부터 그렇다. 8분이 넘어가는 롱테이크 촬영과 할리우드 주류 영화사를 누비는 <플레이어>의 카메라는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그들의 속내까지 포착한다. 눈에 띄는 건 제작자들의 속물근성이나, 개중에는 게으르고 허황된 얘기를 하는 작가, 그런 작가들을 상대하느라 피로에 절은 제작자도 있다. 관람자는 정신없는 할리우드의 풍경도 엿보지만 그 속을 차지한 개별자들의 욕망(야욕, 허영, 욕정)도 엿듣게 된다. 그때 차용한 오프닝 씬을 인용하는 대사가 발설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요즘 영화들은 쓸데없이 컷이 많아. 컷. 컷. 컷. 무슨 MTV 영상도 아니고. 오손 웰즈는 6분이 넘는 오프닝 씬을 찍었다고!” 순간, 저 노골적인 대사가 작가들의 욕망과 결부되진 않는지, 카메라와 동행하는 관람자의 욕망을 꾸짖는 건 아닌지 기소의 대상이 까다로워진다. 그래서일까. 차후 <플레이어>에서 유일한 사건인 ‘작가의 죽음’은 직접적인 보이스오버내래이션으로 장식된다. “<위험한 정사>(1987)의 결말은 누가 새로 썼는지 알아? 백만 여의 작가와 관객들이야.” 은근히 작가를 살해하는 제작자 밀(MR. M)이 관객에게 오명을 쓴다는 뉘앙스를 남기고, 밀이 가벼운 기소로 풀려나는 클라이맥스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프리츠 랑의
을 차용한 것인 동시에, 할리우드로부터 오명을 쓴 예술가에게 바치는 불기소 처분이기도 하다. 물론 <플레이어>에서 주목할 건 많은 차용과 인용의 쓰임새, 모두의 책임론 따위의 스노비즘이 아니다. 이 영화에서 관람자가 엿보고 엿듣는 상황과 속내들은 뚜렷한 위계를 가지지 않는다. 실제로 작가를 살해한 제작자를 빼면 죽은 작가의 애인조차 심드렁한 사건이 ‘작가의 죽음’이다. 알트만이 <캘리포니아 불화>(1974)부터 사용한 다중 녹음기의 장점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고 봐도 좋다(“관객이 경청할 대화를 선택하도록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상황이 다 설명되지 않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만은 <플레이어>에서 작가의 죽음을 할리우드 제작시스템의 오류, 결말에서도 벗겨낼 수 없는 ‘허물(error)'로 다룰 뿐이다. 한편으론 할리우드라는 장소가 지닌 ’타고난 허물(exuvia)’인 것처럼 말이다. 당연히도, 별의별 욕망이 똬리를 틀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욕망이 들러붙는 곳이 할리우드이니 허물(error)도 타고나는 것이다. 그 ‘타고난 허물’이란 것은 방울뱀의 모습과 그 뱀이 산다는 장소(Death Valley)와 그 영화 제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에리히 폰 슈트로하임의 <탐욕>(1924)). 하지만 <플레이어>의 첫 화면에서 물리적으로 예고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묘사한 그림(허상의 물질)과 “세트 안 조용히!”란 경고(허구성의 실추) 사이에 위치한 첫 화면은, <플레이어>가 허물로서의 할리우드, 타고난 허물을 묘사하는 소품(세트장) 격의 영화라는 사실을 알린다. 일종의 선언적 소격효과인 셈이다. 그럼에도 관람자가 이 소격효과를 누락한다면 어쨌거나 할리우드가 매혹적인 탓이다.
<플레이어>로 출연배우들과 함께 칸영화제를 찾은 알트만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신은 할리우드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알트만은 답한다. “아니요. 제 생각엔 할리우드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탐욕스럽게 돈을 벌고 모든 예술가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왔지요.” 알트만은 웃으며 부연한다. “그런데 할리우드의 노력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를 실제로 제거할 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계속 활동하지요.” 알트만은 젠체하는 멍청이가 아니다. 한 편의 영화로 훨씬 더 나쁜 실제에 돌진하는 일은 허상을 생산하고 영화의 허구성을 자랑하는 꼴이다. 어쩌면 단단한 똬리의 중심에서 질식을 자처하는 꼴이다. 알트만은 차라리 허물을 묘사하며 논다. 더 실재하는 배우들과 타고난 허물을 걷어차며 논다. 가벼운 기소라는 까다로운 거리에서, 이단아라는 까다로운 위치에서, 훨씬 더 실재하는 배우들과 허물을 타며 논다. 중요한 건 그 유희를 함께 즐기는 것이고 그 친구들과 계속 활동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훨씬 더 나쁜 실제가 알트만에게 알려준 것은 훨씬 더 여유로워야 한다는 이단아의 덕목이다.
내 생각에 <플레이어>가 주는 카타르시스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출연해준 배우들, 함께 여유를 즐길 이단아 친구들이 100명에 가깝다는 점이다. 그런 일은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도 짜릿한 일이다. 알트만의 타고난 허물에 관한 유희는 <매쉬>(1970)의 결말에서부터(“오늘 밤 보실 영화는 <매쉬>입니다!”), 유작 <프레리 홈 컴패니언>(2006)까지 이어진다(“펭귄이 턱시도를 어떻게 벗을지 고민했답니다”). 알트만은 이단아의 덕목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았다.
- 다음글 오래된 극장 <멀홀랜드 드라이브>
- 이전글 오래된 극장 <커다란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