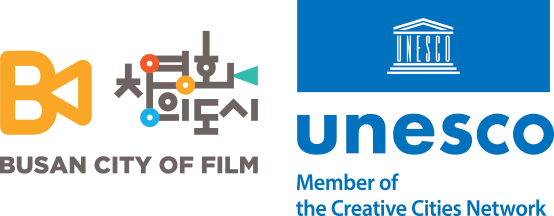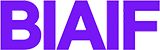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로운 시선

영화로운 시선은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업으로 탄생한 '시민평론단'에게
영화에 관한 자유로운 비평글을 기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부산 시민들이 영화 비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한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오래된 극장 <케스>2020-01-07
-

한 소년의 이야기
한동균(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단)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열다섯 살 소년 빌리 캐스 퍼는
그가 ‘케스’라고 이름 붙인 매를 훈련하며 여가를 보낸다.” - <케스> 로그 라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과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로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두 번이나 거머쥔 켄 로치 감독의 초기작 <케스>(1969)는 흔히, 앞서 제시한 로그 라인과 같이, 영국 요크셔 지방의 노동계층 출신 소년, 빌리(데이비드 브래들리)와 그가 기르는 매 ‘케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케스>란 제목부터 영화 속 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짐작 할 수 있듯이, 이 영화의 서사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의 삶에서 ‘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케스>의 서사에서 매 ‘케스’는 빌리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반자이자, 삶에 시종일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던 그가 유일하게 원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막상 이 영화를 잘 뜯어 보면 매 ‘케스’가 화면에 실제로 나오는 분량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반면,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은 메인 플롯의 전개에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내용(학교의 축구 시합, 주말의 클럽 등)으로 채워져 있다.
<케스>의 내러티브가, 대부분의 주류 영화들처럼 메인 플롯의 전개를 풀어내는데 급급하지 않고, 빌리가 사는 환경의 여러 에피소드를 병렬하듯이 나열한 형태를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노동자 계급을 대변해왔던 ‘블루칼라의 시인’ 켄 로치의 성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케스>를 매와 소년의 이야기로 봤을 때, 빌리를 혼자 집에 두고 클럽에 나가 노는 어머니와 이복형제 혹은 체육 교육이란 본질은 잊고 자신의 득점에만 급급한 체육 선생의 에피소드는 주제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화가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당하는 당시의 현실을 다룬다고 보았을 때 이 에피소드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는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케스>의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것은 매 ‘케스’가 아니라, 등교 전에 신문 배달을 하는 요크셔 지방의 열다섯 살 노동계급 출신 소년,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는 파딩 선생(콜린 월랜드)이 학교에서의 난투극에 개입한 뒤 빌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빌리의 입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진다. “나는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 된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며 살 게 될 것”이라고.
<케스>는 노동계층의 소년이 더 나은 삶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영화이며, <케스>의 내러티브 전개 방식은 이 영화를 관객에게 잘 팔릴만한 영화가 아닌 다른 성질의 영화로 만들기 위한 예술적 선택인 것이다.
이렇듯 <케스>의 내러티브는 영화의 미학적 전략에 의해 주류 영화의 그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는 듯하지만, 할리우드식 주류 서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부분 또한 있다. 바로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빌리는 어느 날 우연히 본 매에 매료되고, 어디서도 이해받지 못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 소년은 자신이 ‘케스’라고 이름 붙인 대상과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파딩 선생과의 대화 장면,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직업 상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빌리는 그 대상을 상실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자각 하지 못한다. 이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그의 환경 때문이다. 결국 ‘케스’는 죽었고, 이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매를 땅에 묻는 것밖에 없다.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보자면, 빌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실패한 주인공이고, <케스>는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어딘지 서툴고 급작스럽게 끊긴 이 영화의 마지막 숏이 어쩌면 이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여지라고 생각하고 싶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던 환경에 어느 날 자신의 관심사와 장래에 관심을 가진 교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빌리 또한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늦게나마 자각하고, 타인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케스의 시체를 꺼내 자신만큼은 오래 기억할 장소에 간직하는 것은 다가올 변화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영화 내부의 서사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케스의 포스터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귀 또한 이러한 나의 희망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덧붙여 둔다.
‘그들은 그 소년을 구타하였다. 그들은 그 소년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그 소년을 조롱하였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빛나는 정신만은 어찌하지 못하였다.’
(They beat him. They deprived him. They ridiculed him. They broke his heart. But they couldn’t break his spirit.)
- 다음글 모리스 피알라 특별전 '모리스 피알라' 감독론
- 이전글 오래된 극장 <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