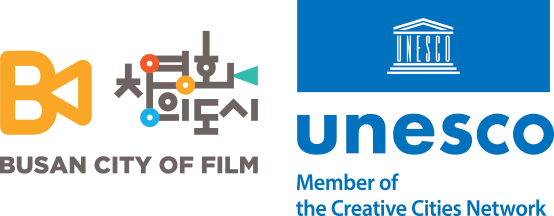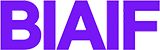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아르헨티나 영화의 새로운 시대 <비올라>, <도둑맞은 남자>2020-11-27
-

활력의 언어들: <비올라>와 <도둑맞은 남자>
이동윤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마티아스 피녜이로의 영화에서 말은 종종 이미지를 압도한다. 그의 영화에서 음성 언어들은 수없이 반복되고 수정되며, 우회하기도 한다. 의미를 고민하는 찰나에도 영화 속 대사들은 여전히 소환되며 말의 의미 자체를 퇴색하게 만든다. 피녜이로는 당초 예상했던 영화의 일반적 서사를 보기 좋게 빗겨나가면서 장면을 찍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영화 속 대화들은 종종 그 자체가 형식으로 기능하는데, 예컨대 그의 세 번째 장편영화인 <비올라>(2011)의 경우, 영화 전체가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대한 리허설로 이루어져있다. 그렇기에 초반은 당혹스럽다. 영화 속 인물의 리허설 대사들은 연습을 위한 이행인지, 실질적인 본심이 담긴 말인지 뚜렷한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은 세실리아인데 제목이 ‘비올라’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비올라>는 셰익스피어의 「십이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본 모습을 가린 채 세자리오라는 남자로 살아가는 비올라처럼 피녜이로의 영화에서 위장이라는 테마는 중요해 보인다. 앞서 밝힌 대로 피녜이로의 영화 속 말과 음성언어는 캐릭터를 설명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기능한다. 말 사이에서도 진심과 거짓이 경계를 허물고, 심지어는 영화의 무대 자체가 거대한 연극과 리허설처럼 진행되며 시종일관 미끄러져나간다. 영화 속 연극에 대해 “셰익스피어의 7편을 그냥 섞어서 몇 줄씩 발췌했다”는 대사는 피녜이로의 영화적 세계관을 잘 드러낸다. 특히나 영화 속 등장인물이 영화의 해적판 CD를 만들어서 판매하며 돈을 버는 것은 원본 연극에 재배열과 수정을 거쳐나가는 것과 유사한 궤를 같이한다.
본체와 거짓된 삶의 차이는 <도둑맞은 남자>(2007)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첫 장면에서 모더니즘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메르세데스는 “감성의 정교함, 상상력의 발달, 영적 생활의 고취”라고 마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막힘없이 대답한다. 이 외에 박물관 가이드로서 역할을 읊는 그녀의 모습은 짐짓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사람처럼 그려진다. 하지만 그녀는 박물관의 유물을 팔아넘겨 돈을 벌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연극 무대 리허설을 영화 전체의 형식으로 차용한 <비올라>와 비슷한 인상을 준다.
또한 피녜이로의 영화는 등장인물 중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려울 정도로 카메라가 시종일관 이곳저곳을 오가기도 한다. 어떤 영화들은 화면의 전경을 담아내기 위해 화면을 넓게 사용한다면 <비올라>의 경우 인물을 화면 안쪽으로 우겨넣고 공간의 확장을 제한한다. 또한 인물-장소에 대한 점프컷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의도적으로 정보의 생략을 추구한다. 자유롭게 유랑하는 카메라와 달리 파격적인 형식을 취하며 둘 사이의 오묘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 긴장의 선봉은 파편화된 이미지와 사운드가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의 영화를 증축하고 있는 것을 꼽자면 그 무엇보다도 활동적인 상태 그 자체일 것이다. 이를테면 <비올라>에서 시종일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세실리아와 <도둑맞은 남자>에서 어디론가 계속 뛰어다니는 메르세데스의 움직임이 그렇다. 피녜이로는 때로는 트레킹을, 때르는 클로즈업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같은 포지셔닝에 따라 인물들은 자유자재의 동선을 그려내지만, 그럼에도 공간 안에 포섭되곤 한다. 이를테면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사용하는 <비올라>의 분장실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여성들 사이로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오간다. 이 장면에는 인물간의 특별한 위상적 지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질문과 응답, 재응답의 기로에서 공간을 오갈 뿐이다. 다시 말해, 피녜이로는 말을 하는 사이에서 특별한 것을 증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하다. 인물이 말을 하는 곳에 카메라가 위치해야한다는, 어떤 믿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도둑맞은 남자>에서 계속 등장한 도밍고 사르멘토의 구절에 기타 반주를 옮기는 장면 역시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다. 건물 내부의 난간에서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누군가는 구절을 읊고, 기타를 치며, 책을 보고 있다. 구절이 끊임없이 인용하고 기타 반주가 간간히 흘러나온다. 이 장면의 초반부, 책 구절과 기타 소리는 묘하게 중첩된다. 그러다 급작스레 카메라는 인물로부터 멀어지는 동선을 그려낸다. 구절을 읊는 소리와 기타를 치는 소리 역시 점차 화면으로부터 멀어지고 두 소리는 점차 분리되어 떨어져나간다. 마지막 쇼트에서는 구절 인용이 멈추고 기타 소리만 남겨진다. 이 화면의 과정은 인물의 동선에서 중심이 되었다가 또 다시 멀어지기에 오묘한 활력을 준다.
미로와 같은 동선은 <도둑맞은 남자>에서 숱하게 등장한다. 이를테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작품들과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는 인물들은 야외에서 차와 차 사이를 거침없이 질주하기도 한다. 또한 다소간 격정적인 로맨스가 성사되는 곳은 식물원인데, 이들은 공간 사이에서 비집고 자리하고 있다. 일상적인 공간에 대해 끊임없는 반복과 배열을 진행하는 영화는 이내 관찰자적 시선을 뛰어넘고 불균질한 상태 그 자체로 관객을 안내하는 것이다.
- 다음글 아르헨티나 영화의 새로운 시대 <기묘한 이야기들>
- 이전글 아르헨티나 영화의 새로운 시대 <더 골드 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