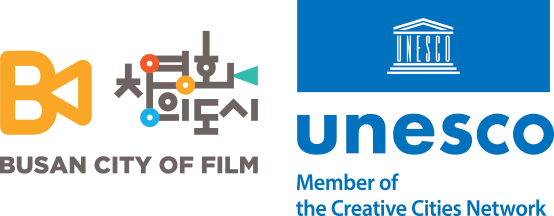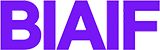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앙코르, 아녜스 바르다 <라이온의 사랑>2020-12-18
-

<라이온의 사랑>: 신세계의 바르다
이상경(부산영화평론가협회)
자크 드미의 <쉘부르의 우산>(1964), <로슈포르의 숙녀들>(1967)에 대한 러브콜로 아녜스 바르다는 그와 함께 할리우드로 떠난다. 미국에서 남편의 작업과 별도로 바르다는 두 편의 단편 다큐멘터리 작업을 마치고 극영화 <라이온의 사랑>(1969)을 완성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영화는 다큐-픽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은 서사와 많은 사실적 묘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영화를 발명했다고 평해지는 데뷔작 <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1955)을 고려하더라도 <라이온의 사랑>은 더 많이 나아간 작품이다.
인물들이 카메라 쪽을 노려보듯 쳐다보는 초보적 소격효과는 약과다. 등장인물들은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의 저작권료 때문에 “아녜스”가 이 장면을 잘라낼 거라며, 외화면의 그녀를 대사로 끌어온다. 카메라 뒤에서 동료들과 웅크린 바르다를 기어이 비추는가 하면, 등장인물 중 한 명은 카메라와 아녜스 사이를 방해했다며 사과하기도 한다. 또 다른 등장인물은 여행으로 인해 피곤하다고 돌아보면서 카메라를 끄라고 말한다. 카메라를 끄라고 한 그 등장인물은 자신의 자살 신에서, 나는 배우가 아니어서(실제로 인디영화 감독인 셜리 클라크) 도저히 못 하겠다며 바르다와 실랑이하다 바르다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 시범을 하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배우’로 출연하는 극영화다, 고 썼지만 어딘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분장을 해도 자신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자신의 원래 신분과 배경이 가장 강력한 분장이자 캐릭터다. 제일 중요한 캐릭터는 저명한 미술, 팝아트, 영화 제작자인 앤디 워홀의 여배우 비바이다. 워홀의 영화에서 누드로 출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 영화에서도 그 이미지를 십분 활용하면서 워홀과의 관계를 서사적으로 엮어낸다. 두 명의 남자 주인공들은 최초의 성공한 록 뮤지컬 <헤어>(1968)의 원작자, 배우, 가수, 작사가들인 제임스 라도(제리)와 제롬 라그니(짐)이다. <헤어>는 성 혁명, 베트남 전쟁 반대 등을 표방하는 히피 문화 장르이고, 자신들이 직접 머리를 기르고 히피들과 교류했던 두 남자 주인공들의 이미지는 영화 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비바의 집에 동거하며 그녀를 각기 사랑하면서도 갈등이 없는 두 명의 남자라는 설정은 그 자체로 가부장적 결혼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읽힌다. ‘사자머리’를 한 세 남녀의 모습은 직관적으로 제목을 연상케 하지만 영화 안에서 사자는 다양한 은유와 직유의 원천이기도 하다.
영화의 제일 처음, 이 남녀들은 앤디 워홀이 영화화하기도 한 마이클 맥클루어의 연극 <비어드(Beard)>(1965)의 공연장에 등장한다. 그들이 극장에 나타났을 때와 연극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보내는 환호는 공연에 대한 것인지 이미 스타인 그들을 향한 것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바로 환영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경계가 취약한 기초 위에 놓여 있음을 상기시킨다. 배우들이 가상의 마네킹으로 둘러싸인 연극 무대의 분위기도 이 영화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마중물로 충분해 보인다.
비바와 그녀의 남자들은 이 연극을 재현, 패러디한다. 이것은 물론 그들의 유희를 위한 것이다. 영화 초반부, 그들은 이리와 매춘부(harlot)라고 부르다가 발음을 이용하여 car lot, parking lot 하는 식의 말장난으로 의미를 탐색하려던 우리의 탐침을 뭉개버린다. 턱도 없는 말장난을 일삼던 그들은 슬슬 의미 있는 자의식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두 남자 가운데 하나인 제리는 난 ‘비어드’가 싫어 ‘헤어’가 좋아, 연극이 싫고 음악이 좋아 하면서 내달을 때, 모방의 대상보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애정을 과시할 때, 우리는 이들의 유희가 농담과 정색을 교차하고 있음을 눈치 채게 된다. 모발의 형태를 이용해서 쓸데없는 언어적 유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진지한 자기과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만 때는 늦었다. 저들의 장난에서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놓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하위문화에 대한 이해나 그에 대한 재전유 형식을 탐구하는 부분은 이 영화의 기조가 아니므로 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신세계의 배우들은 바르다가 수행해 왔던 영화적 탐구를 그들의 놀이 속에서 수행한다. 실제의 사람들이 배우가 될 수 있는지(<라 푸앵트 쿠르트로의 여행>), 실제의 시간이 영화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 1962)와 같이 바르다가 했던 질문은 이 영화에서 반복된다. 그들은 실제의 사람이면서 배우가 되고, 살아 있으면서 사랑하면서 ‘사자’가 될 수 있을지 묻는다. MGM 영화사 로고의 사자머리까지 동원한, 영화의 부연적 숏을 빌지 않더라도 사자는 명백히 영화나 배우의 은유다. 이쯤 되면 이 영화는 메타-영화로서의 자기선언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영화의 사유는 영화에서 끝나지 않고 문명으로 향한다. 비바가 자신의 집 밖에 플라스틱으로 조성된 가짜 새의 낙원이 진짜 식물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러한 비바의 과시가 바르다나 당대 관객들의 야유나 개탄으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비바는 현대 예술의 총아 앤디 워홀의 배우가 아니던가. 그런 의미에서 바르다의 이 영화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재처럼 인식되는 대체물을 의미하는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주창하는 보드리야르(《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1981)의 개념을 선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바는 암살당한 로버트 케네디에 대한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서, “이건 국가적 취미야,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죽음”이라고도 내뱉는다. 바르다식 문명비평이다. 이렇게 비바는 워홀뿐만이 아니라 바르다의 배우가 된다.
영화의 제일 마지막, 짐을 연기하던 배우는 드디어 사자머리를 벗어 던진다. 비바도 카메라 앞에서 앤디 워홀과는 다른 방식의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말한다. 이제 환영은 끝나고 실제의 완전한 승리를 낙관해도 좋을까. 비바는 돌연 숨만 내쉬는 포즈를 3분 이상 보여주고 바르다는 순간순간 스태프에게 시간을 체크하다 겨우 “컷” 소리를 내며 영화가 끝난다. 비바의 마지막은 사자일까, 실제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며 바르다는 그 이후로도 평생 영화를 찍다가 지금은 저 먼 별나라로 떠났을 것이다.
- 다음글 오래된 극장 2020 - 젊은 윌리엄 와일러 : <편지>
- 이전글 미국 인디의 전설: 존 카사베츠 & 짐 자무시 <오프닝 나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