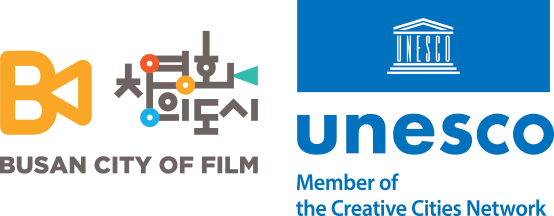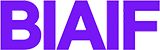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종착역> : 인물이 된 카메라2021-10-20
-

<종착역> : 인물이 된 카메라
김민우(부산영화평론가협회)
0.
<종착역>(2021)을 보고나서 누군가에게 영화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름방학 때 ‘세상의 끝’을 찍어오라는 다소 황당한 숙제를 내주는 장면부터 기억날지 모르겠다. 느슨한 내러티브 중에 그나마 사건을 추동하는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착역>에서의 출발은 그야말로 극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연(설시연)이 사진 동아리 ‘빛나리’에 가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선생님을 찾아간 때, 그녀는 이미 카메라와 여행을 떠날 것을 예비한다. 그리고 <종착역>에서의 카메라는 예비한대로 하나의 인물처럼 기능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종착역>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종착역>은 분명 시연이 동아리를 가입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가는 신부터 시작하지만, 서사는 마치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있는 것처럼 진행된다. 그녀는 어떤 전사도 없는 채로 제시되며, 하다못해 왜 사진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싶은 건지 부연하는 사건도 없는 채로 마무리 된다. 보통의 극영화에서 흔히 만들어지는 사건이나 발단, 전개와 같은 내러티브 구조나 인물의 내면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를 암시하는 장면도 있다. 존포드의 <역마차>(1939)를, 그것도 사운드와 자막 없이 틀어놓은 채로 (당연히) 누구도 보지 않은 채 시간을 죽이는 신을 보자. 이 장면은 확실히 이상하다. 고전영화 동아리가 아니고서야 중학생들 보라고 틀어 놓을만한 영화도 아니거니와 자막과 소리를 빼버려 영화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어놓으니 영화를 볼 리가 만무하다. 이 순간에 담긴 모든 것은 극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영화 속 영화’마저 성립이 불가능한 세계인 것이다.
단순히 하나의 시퀀스뿐만 아니라 <종착역>의 전반적인 태도가 모두 이렇다. 영화에 등장하는 4명의 소녀들이 어떤 계기로 친해지게 되는지, 사진 동아리에 시큰둥해 보였던 선생님이 어째서 갑자기 ‘세상의 끝’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그것도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오라 하는지, 여행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따라가게 된다. 재밌는 건 영화가 이토록 비논리적 세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 그들에게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카메라가 주목하지 않아 우리는 모르는 이 세계를, 재잘거리는 소녀들의 대화나 정지된 스틸 사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체해버린다는 사실이다. 그건 서사의 공백을 어물쩍 넘기려는 수단이 아니라, 미확정된 서사를 통해 확정된 서사가 불러오는 상상의 공백을 채우려는 의지에 가깝다.
미확정된 서사는 공간을 무화시키기도 한다. 실상 지하철역의 끝이지만 신창역은 소녀들에 의해 ‘세상의 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본 결과 세상의 끝이라기엔(말마따나 ‘딱 끝’인줄 알았는데) 전혀 끝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구역사, 즉 정지된 공간으로 규정된 채 거꾸로 뒤집힌 옛 신창역을 찾기로 한다. 그 순간 ‘신창역’이라는 공간은 신역사와 구역사(의미심장하게도 ‘역사’라는 단어를 공유한다)로 연결되어 확장하고, 더불어 정지되었던 공간은 다시금 ‘세상의 끝’처럼 여겨져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있게 되지만, 곧바로 인물들의 목표는 희미해지면서 공간 역시 어떤 의미도 띄지 못한 채 무화되어버린다. 이렇듯 미확정된 서사는 규정되어있던 공간을 무화시키고, 무화된 공간은 미확정인 상태로 남겨지며 포섭된다.

2.
미확정된 서사 앞에 놓인 카메라의 위치는 그래서 중요해진다. <종착역>을 두고 흔히들 다큐멘터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여기서는 다큐멘터리의 그것처럼 우연을 찍는다거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합의되지 않은 일을 관찰한다거나 혹은 영화 안의 인물들이 카메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에서 찍은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극화된 장면이다. 분명 들리지 않을만한 거리임에도 또렷이 들리는 대사는 이곳이 영화의 세계임을 정확히 주지시키고, 영화의 중간 중간 삽입되는 스틸 사진은 서사가 진행하는 동안 잠시나마 화면을 장악하면서 영화를 멈춰 세운다. 마치 기차가 역에 정차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스틸 사진들은 주인공들이 찍은 사진이라는 ‘설정’을 부여받으면서 도리어 영화의 진행에 징검다리로 훌륭히 수행해낸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종착역에 이르러 멈춰야하는 기차처럼 영화 역시 멈추어야 하는 숙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착역>은 감독의 기획에 따라 짜인 세계라는 걸 숨기지 않으며, 영화 안의 요소들은 명확한 형태나 역할을 부여받는다, 영화는 미확정적인 요소와 확정적 요소가 뒤섞이며 서로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기한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물화된 카메라는 바로 그 지대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카메라는 종종 고정된 위치를 잡고 인물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반대로 인물이 서 있는 곳을 쫓아가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는 멀찍이서 뒤쳐진 친구를 기다리거나 혹은 미처 보지 못한 친구들을 쫓아가는 아이의 움직임 같다. 마치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인물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 <종착역>의 카메라는 그저 자신이 아는 부분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발견이나 우연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찍는 부분을 철저히 기획하되 그 사이의 공백은 정말로 모른다는 고백에 가깝다. 오로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드러내겠다는, 그야말로 극의 일부가 되어버린 카메라는 이제 인물이 된다.
인물이 된 카메라는 말 그대로 인물처럼 영화 안에서 상정된다. 다시 처음 시퀀스를 떠올려보도록 하자. 아직 인물들과 친해지지 않은 그는 섣불리 시연에게 접근하지 못한 채 교실 밖에서 멀찍이 쳐다보거나, 그녀가 가는 길을 멀리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여행이 진행되면서 그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처럼 카메라도 어느 샌가 다가서있다. 그건 감독이 특별한 기술을 쓴다거나 장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니, 오히려 앞서 말한 미확정적 서사와 일상의 대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물과의 동일시를 거부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카메라는 오직 성실하게 그들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인물화된 카메라에 의해, 우리 역시 그들과 지금 이곳으로 함께 여행을 온 것임을 지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시선의 객체로만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청자가 되며, 친구가 되는 것이다.

3.
인물의 내면에 대한 어떤 사건이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후반부가 마음을 뒤흔드는 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친구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종착역에 다다른 영화는 마지막까지 사려 깊게 인물을 대한다. 영화의 마지막,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보낸 시연이 새벽같이 일어나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시연이 친구들을 찍고 있지 않음에도 카메라는 셔터음에 맞추어 친구들의 얼굴을 비춘다. 이별을 앞둔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간직하려는 것처럼. <종착역>은 자신만의 태도로 새로운 가능성을 정교하게 조각해내는 작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신이 영화를 찍고 있음을 안다는 점이다. 이제, 카메라는 문 밖을 나선다.
- 다음글 <사상>: 통증의 장소들
- 이전글 <좋은 사람> : 마주치지 않았던 두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