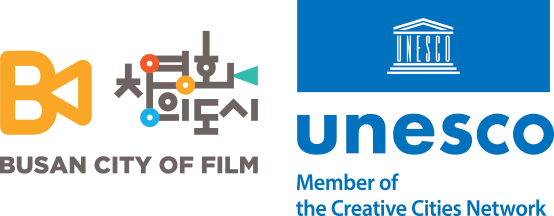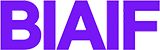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일상의 소소한 용서들 - <소설가의 영화>2022-04-28
-

일상의 소소한 용서들 - <소설가의 영화>
강선형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홍상수 감독의 스물일곱 번째 장편영화 <소설가의 영화>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이후로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과 <당신얼굴 앞에서> 두 편만을 예외로 하고 꾸준히 출연하고 있는 김민희는 물론이고, <당신얼굴 앞에서> 이후 연속으로 출연하는 이혜영, <도망친 여자>, <인트로덕션> 등 젊은 여자와 함께 등장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옥희의 영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다수 출연하고 있는 서영화, 마찬가지로 출연의 역사를 따지자면 <다른나라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 후>, <당신얼굴 앞에서> 등 영화감독으로 출연하고 있는 권해효, <강변호텔>, <풀잎들> 등의 기주봉이 출연하는 영화이다. 이 인물들은 때로는 같은 인물로 때로는 다른 인물로 등장하지만 직업이나 관계의 변화만 있을 뿐,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타인을 대하며 살아온 사람들처럼 보인다.

<소설가의 영화>에서 길수(김민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우를 그만두고 소소한 관계들과 원칙들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로 등장하는데, 이전의 작품들에서 김민희가 연기한 아름, 만희, 감희 등도 그렇다. 방황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럼에도 자기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인물. <당신얼굴 앞에서>에서 ‘상옥’이라는 오랜 기간 스크린으로부터 떠나있던 배우를 연기한 이혜영은 <소설가의 영화>에서 오랜 기간 소설을 쓰지 못하고 있는 소설가 ‘준희’를 연기한다. 두 인물은 모두 사람들이 갖는 표면적인 관심들, 아마도 과거 저편에 있었을 것인데 기어코 꺼내어지는 관심들에서 이질감을 느낀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친절하지만 늘 넘어갈 수 없는 경계를 긋고, 때로는 침범하는 모든 관계가 버거워 다 버리고 떠나는 서영화의 역할들 등등.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다른 우주에 살고 있을 같은 인물들을 우리 앞에 계속해서 데려다 놓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된다.
늘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는 동일한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동일한 것의 반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를테면 복제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 홍상수 감독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벗어나기 힘든 문제들을 다룬다. 나의 죽음 또는 타인의 죽음이라는 문제, 일상의 소소한 잘못들, 또 용서들, 방황 그 자체(어쩌면 여행일)로서의 삶. 새로운 얼굴들에 늘 같은 것들이 환등처럼 비추어진다면, 그것은 모든 삶들이 독특한 우주를 이루듯이 독특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이를테면 무수한 독특성들의 반복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풀잎들>, <강변호텔>, 그리고 <당신얼굴 앞에서> 등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소설가의 영화>는 홍상수 감독이 꾸준히 그려왔던 일상의 소소한 용서들을 다룬다. 준희(이혜영)가 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하남으로 떠난 세원(서영화)을 만나러 갔던 길에서 우연히 만난 효진(권해효)와 그의 아내, 양주(조윤희)는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쉽게 용서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준다. 과거 준희의 소설을 영화화하기로 했던 효진은 제작사의 핑계를 대며 영화를 무산시켰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만난 준희에게 효진은 제작사에서 막았기 때문이라고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러고는 과거의 자신은 영화밖에 몰랐고 그래서 실제 삶은 망쳐버렸지만, 이제는 편해졌고 삶과 삶의 주변을 챙기려고 한다고 말한다. 준희는 그런 효진에게 과거에도 악착같았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꼬집는다. 효진 스스로는 영화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악착같은 삶의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준희의 말을 효진은 두루뭉술하게 떠내려 보낸다. 아마도 과거에도 그는 그랬을 것이다. 효진이 자신이 했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들은 다 무시하고 타인과의 화해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만 손쉽게 화해하고 있다는 것, 준희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없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던 준희와 효진의 만남은 우연히 길수(김민희)를 만나면서 파행된다. 연기를 쉬고 있는 길수에게 ‘아깝다’고 말하는 효진을 향해 준희는 다 큰 성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왜 아깝다고 말하느냐고 소리친다. 제작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을 쏙 빼고 이야기하는 효진보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길수가 더 아름답다고 외치듯이 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일상적인 용서들은 그 자신에게는 소소할지 몰라도 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소소한 용서들은 무수한 자기기만들만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어디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것이랴. 효진의 팔을 꼭 감싸고 있는 양주의 인생이 다 그런 것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보편화는 어떤가.

소설가 준희는 바로 그 때문에 소설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진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껏 자신이, 그리고 그래도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묻는 만수(기주봉)가 당연하게 생각해 온 바로 그것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무리 작은 왜곡이라도 그것은 왜곡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왜곡이다. 그래서 준희는 소설이라는 것은, 또 영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는 핑계 뒤로 숨지 않고, 꾸밈없이 진짜를 담아내는 영화를 찍기로 한다. 소설이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면, 영화는 어떤 매개도 없이 투명하게 진짜를 그 자체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작된 준희의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 영화이다. 우리는 영화관에 앉아 있는 길수와 함께, 길수인지 김민희인지 모를 인물이 공원에서 꺾어 만든 부케를 들고 결혼행진곡을 부르며 웃고 있는 영화의 일부분을 본다. 이 ‘소설가의 영화’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의 시도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본 <소설가의 영화> 전체를 홍상수 감독의 일기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허구의 영화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일까? 홍상수 감독의 개인사와 완전히 엮어서 모든 것들을 다큐멘터리적인 기록으로 여기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그의 개인사와 영화를 분리해 그의 개인사에 일종의 철퇴를 가하면서 동시에 그의 작품만큼은 구출해내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그것은 한없이 투명하고 또 투명하다.
영화 속 영화인 ‘소설가의 영화’와 함께 영화 전체가 끝나는 것처럼 크레딧이 올라간 뒤, <소설가의 영화>는 다시 시작되는데, ‘소설가의 영화’가 끝나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길수의 모습이 비친다. 길수는 준희도, 경우(하성국)도 없이 텅 빈 영화관에 앉아 있다. 길수는 자기 삶을 투명하게 비추는 그 영화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효진이나 양주처럼 소소하게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까? 우리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껏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듯이 그렇게 길수는 멈춰있다.
- 다음글 클로드 샤브롤 감독론
- 이전글 영화 <복지식당>이 바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