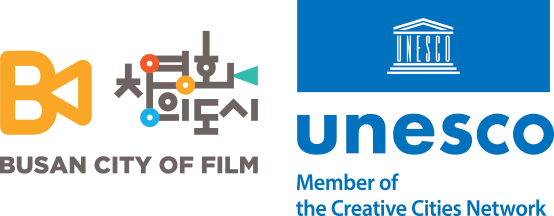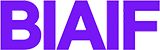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로운 시선

영화로운 시선은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업으로 탄생한 '시민평론단'에게
영화에 관한 자유로운 비평글을 기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부산 시민들이 영화 비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한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현실과 장르의 경계에서 <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2-05-03
-

현실과 장르의 경계에서
<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미성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단
‘구소련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솔깃한 수식에 이 영화가 궁금해지지 않기란 힘들다. 고려인 4세 출신의 귀화 한국인 감독 박루슬란은 어린 시절 카자스흐탄에서 흉흉한 풍문으로 듣던 인육 살인마 사건의 전말을 영화에 담기로 한다. 범인 알릭 코라자노브(본명 니콜라이 주마갈리에브)는 베테랑 경위 스네기레브와 감 좋은 초짜 형사 셰르의 추적에 덜미를 잡히지만 당국은 1980년 치러질 모스크바 올림픽에 지워질 오점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한다. 현재 니콜라이 주마갈리에브는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감 돼 있고, 그런 연유로 영화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부제가 붙게 되었다.

언론에서 관습적으로 칭해온 ‘걸작A의 다른 버전’이라는 상투어가 대개 사실이 아니듯, <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하 <쓰리>)에서 연쇄살인마를 잡으려 하지만 잡지 못한다는 외연적 사실 이외에 <살인의 추억>과 비슷한 점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쓰리>는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이 남긴 미궁의 감각보다 체제의 부조리에 적확한 혐의를 주장하는 고발적 성격이 훨씬 두드러지는 쪽이다. 그러나 한낱 식량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빈번하고, 노동하지 않은 죄로 구속되는 나라에서라면 민생의 치안을 저버리고 국가의 위상을 선택하는 적을 겨냥한 영화가 탄생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범인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줄곧 사명감을 보인다. 노트에는 “타락한 여자의 피는 초인적 힘을 가져다준다. 그것을 통해서만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여자는 더러워. 누군가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지”라는 말도 대수롭지 않게 던진다. 마치 ‘해야할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기이한 신앙심으로 인한 교조적 태도는 <살인의 추억>보다도 되레 데이빗 핀처의 <세븐> 속 살인마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쓰리>는 실제 사건에 기반하고 있으나 전개 과정은 리얼리즘 영화라기보다 스릴러 장르물의 고전적인 양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장르의 전개 양상은 할리우드가 아닌 한국 관객에 익숙한 감수성이 다분히 녹아 있다. 러시아 배우들이 등장해 구소련의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끔찍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인 스탭들과 합작한 15년 차 귀화 한국인 감독의 영화라는 점에서 <쓰리>는 두 나라의 정체성이 묘하게 겹친 영화로 비친다.
이렇게 리얼리즘과 장르적 클리셰를 오가는 와중, <쓰리>는 실제가 아닌 허구의 인물을 통해 일말의 작가적 시선을 갖는다. 그것은 형사 셰르와 누나의 관계, 범인 알릭과 누나의 관계 양자 간에 보이는 유사성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서로를 유일한 피붙이로 의존해온 셰르 남매에게서 누나의 집착은 균열의 원인이 된다. 비틀린 모성이라는 낡은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는 누나의 과도한 근심은 “남자가 없어서”라는 셰르의 혐오를 부추긴다. 이로 인해 누나의 실종이 벌어지는데, 한편 동생의 범죄 행각을 은폐하던 공범자 누나는 알릭이 발각돼 연행되는 순간에 마치 현실의 고리를 끊어내듯 절규한다. 이 절규는 셰르의 누나 디나에게서 보았던 뒤틀린 애정을 다소간 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셰르와 알릭의 남매애를 나란히 펼쳐두고 <쓰리>가 과연 이 테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인이 혼란을 주고 있으나, 죄인에게 죄를 묻지 못할 사태를 만든 주범과 경위는 명확히 적시된다. 하지만 가리켜진 주범은 몇 마디 대사와 레닌 동상 이미지로 휘발되고, 장르의 규칙을 좇는 다급함에 고발의 메시지 역시 집어 삼켜진 듯한 인상도 남는다. <쓰리>는 살인의 추억도, 세븐의 후발 주자도 아닌 독자적인 노선의 영화다. 무게를 싣고자 한 이야기를 더욱 고집스럽게 풀어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감독 박루슬란을 눈에 띄게 한 영화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 다음글 <모어> 경계 너머의 아름다움
- 이전글 <브로커>, 모성은 어디에서 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