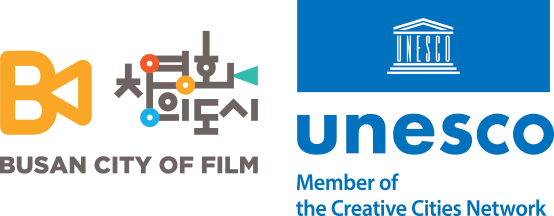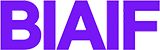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한, <외계+인 1부>2022-07-27
-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한, <외계+인 1부>
강선형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외계의 죄수들을 인간의 몸에 가두어 놓는다는 설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외계+인 1부>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외계의 생명체들과 인간들에 관해 영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종합선물 세트 같다. 외계 생명체, 로봇, 시간여행, 외계 생명체 또는 로봇에게 자란 어린아이부터 외계인만큼 평범하지 않은 도사들 등등. 디즈니 영화의 캐릭터들을 모두 모아놓은 디즈니랜드처럼 영화의 역사에서 이제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설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듯 등장한다. 제목의 더하기표(+)가 ‘외계’와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끝도 없이 확장하겠다는 뜻을 가리킨다는 듯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해 본’ 영화가 <외계+인 1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백화점에 딱 하나 없는 것이 있다면 새로움이다. 이를테면 이 영화는 ‘익숙한 것들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여러 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오마주처럼 보이는 장면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영화의 첫 시작부터 떠올리게 만드는 <백 투 더 퓨처>이다. <외계+인 1부>는 가드(김우빈)가 탈옥한 죄수들을 쫓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다른 시대(또는 여러 우주들 가운데 하나)로 도망간 죄수를 잡기 위해 ‘시간의 문’에서 튀어나오는 가드의 자동차의 모습이 <백 투 더 퓨처>의 시간여행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또 하나의 오마주는 <터미네이터>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항하는 죄수들과 싸우기 위해 가드가 인간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로봇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터미네이터>에서의 과정과 아주 동일하게 표현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드 로봇의 형태 자체는 터미네이터보다는 엑스맨 시리즈의 센티넬과 마블 시리즈의 울트론을 합쳐놓은 것처럼 보인다.

열거할 목록이 많아 조금 더 확장하여 이야기해보자면, 도시 한 가운데에 침공하는 비행체는 <컨택트>의 비행체 디자인과 유사하고, 설계자를 탈옥시키기 위해 지구에 온 로봇은 <에반게리온>의 사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외계 생명체가 촉수를 활용하여 인간들을 제압하는 방식이나, 지구의 대기를 바꾸기 위해 비행체가 싣고 온 물질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난 뒤 좀비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의 모습들 역시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오랫동안 봐온 장면들이다. <더 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괴생명체의 척수의 모습은 할리우드에서 이제 익숙한 모습이고, 얼마 전 한국에서도 <스위트홈>에서 구현된 바 있으며, 바이러스와 좀비를 같은 방식으로 구현한 영화들은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매트릭스>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공격을 피하는 이안(김태리)이나 <미션 임파서블>처럼 신검을 훔치는 무륵(류준열), 흑설(염정아)과 청운(조우진)이 <강시>처럼 자장(김의성)을 봉인하는 장면 등은 의도적으로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패러디지만, 그 외에도 영화의 거의 모든 요소들이 익숙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그 익숙함이 이 영화의 정체성을 이룬다. 보다 최동훈 감독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찾을 수 있다면, 영화 속 육백 년 전 과거에서 이루어지는 도술들과 신비로운 도구들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분신술, 둔갑술이나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동물 등 그 역시 이미 <전우치>에서 보여주었던 것들이 많다. 이처럼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과거와 현대의 서울을 오가며 외계 생명체와 싸우는 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에는 사실상 새로운 이미지가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익숙한 것들만을 나열하기는 했지만, <외계+인 1부>는 인간의 몸이 하나의 감옥이 되는 설정이나 그것을 위해 오랜 시간을 낯선 지구에 머물러야 하는 가드와 같은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또 시각적인 즐거움이나 재치 있는 대사 등 많은 매력을 가진 영화이며, 1부 안에서도 많은 설정들을 제대로 회수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완결적인 구조로 끝난다고 볼 수 있는 영화이다. 그러나 문제는 2부이다. 앞서 말한 새로움의 부재는 2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감시킨다는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된다.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거듭되는 새로운 이야기의 얼개 등에 대한 기대감을 관객들에게 부여하기에는 너무도 익숙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과연 <외계+인 2부>는 익숙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 1부에서는 다 보여주지 않은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면, 관객들은 기꺼이 2부를 위해 극장을 찾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봉합되든 관객들은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2부에 남겨진 과제는 ‘새로움’이자 ‘오리지널리티’이다. 예컨대 1부에서는 일부만 드러난 설정이지만 영화에서 하나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기억이라는 테마가 그 과제를 수행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 기억만이 가능하게 하는 외계생명체의 연속성과 정체성이 2부에 좀 더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전개를 이끌어내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다음글 영화 <초록밤>을 가득 채운 것들
- 이전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볼 결심을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