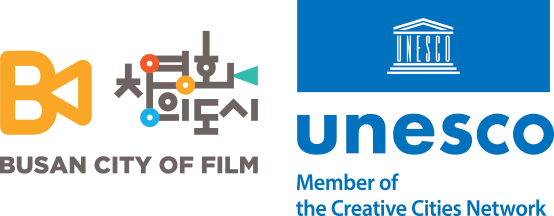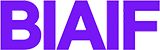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 영화를 향한 <바빌론>의 직유법2023-02-08
-

영화를 향한 <바빌론>의 직유법
강선형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몇 년째 명감독들의 과거 할리우드 재현 영화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코엔 형제의 <헤일, 시저!>가 있었고, 우디 앨런의 <카페 소사이어티>도 있었으며, 2019년에는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가, 2020년에는 데이빗 핀처의 <맹크>도 있었다. 할리우드 재현은 아니지만 곧 개봉할 스필버그의 <더 파벨만스> 역시 과거로 돌아가 그의 어린 시절을 채웠던 영화의 꿈을 그린다. 왜 이런 영화들이 부쩍 자주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시기를 그린 2011년의 영화 <아티스트>나, 스콜세지의 멜리에스에 바치는 헌사인 <휴고> 같은 영화들이 그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단지 비슷한 영화들을 유행처럼 양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예술 자체의 위기가 계속해서 할리우드를 가장 빛나던 시절로 되돌려 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장 빛나던 시절, 그렇지만 그런 빛의 이면에는 <헤일, 시저!>가 그린 것과 같은 매카시즘 열풍도 있었고, <맹크>에서 그려진 것과 같은 정치와의 결탁도 있었으며, 폭력과 마약, 착취도 있었다. 수많은 이들의 꿈으로 쌓아 올린 영화 도시는 지하에 깊은 어둠을 간직하고 있고, 그 도시에서 탄생한 영화는 찬란하게 빛나며 동시에 도시에 자신의 꿈을 내바친 자들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바빌론>은 그런 거대한 영화 도시의 풍경이다.

<바빌론>은 <아티스트>처럼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던 시기를 그린다. 이 시기를 그려내기 위해 데이미언 셔젤은 많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니 토레스(디에고 칼바)는 쿠바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1930년대 활동한 르네 카도나 감독이 그 모델이다. 르네 카도나는 잭 콘래드(브래드 피트)의 모델이 된 무성영화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한 루돌프 발렌티노와 함께 활동하기도 했고,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활동하다 1932년에 할리우드를 떠나 멕시코에서 멕시코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넬리 라로이(마고 로비)는 클라라 보우와 가장 유사한데, 그녀의 가정환경이나 그녀를 따라다닌 여러 스캔들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며 관객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잔느 이글스, 조안 크로포드, 앨머 루벤스 같은 배우들도 모두 넬리와 함께 숨 쉰다. 잭 콘래드의 모델은 루돌프 발렌티노나 더글러스 페어뱅크스 같은 무성영화 배우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깝게는 존 길버트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잭 콘래드의 처음과 끝을 지켜보는 칼럼니스트 엘리노어(진 스마트)는 클라라 보우를 ‘잇걸’로 만든 원작 소설 『잇』의 작가 엘리노어 글린, 무성영화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포토 플레이 잡지에서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도맡았던 기자 아델라 로저스 세인트 존스, 가십 칼럼니스트였던 로엘라 파슨스가 모델이 되었다. 넬리를 데뷔시키게 되는 여성감독 루스(올리비아 해밀턴)는 당시 활동했던 로이스 웨버, 도로시 데이븐포트, 도로시 아즈너 등이 모델이 되었고, 레이디 페이 주(리준리)는 안나 메이 웡이 실존 모델이며, 트럼펫 연주자 시드니 팔머(조반 아데포)는 듀크 엘링턴, 루이 암스트롱, 에델 워터스, 커티스 모스비, 레스 하이트, 소니 클레이 등 유성영화가 도래하며 스크린에 비춰질 수 있었던 흑인 연주가들이 모델이 되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흑인에게 검은 분칠을 하는 무수한 차별 속에서도 말이다.

이렇게 <바빌론>은 실존 인물들과 아버클 스캔들 등 실제 사건들을 하나둘 쌓아 올려 바빌론을 건설한다. <바빌론>이 구체적으로 그리는 시기는 정확히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인데,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1952년의 영화 도시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해당 년도가 자막으로 등장하면서 그려지는 할리우드의 풍경은 할리우드 영화사를 충실히 따라간다. 영화의 첫 시작인 파티가 벌어지는 1926년은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싱어>가 개봉하기 1년 전이며, 파티에 동원되는 코끼리를 끌고 가며 매니가 언급하는 것처럼 그레타 가르보가 대체 불가능한 스타였던 해이다. 그레타 가르보는 <바빌론>의 잭 콘래드의 모델이 된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인 존 길버트와 연인이기도 했고, 존 길버트가 유성영화 시대가 도래하며 외면받았던 것과 달리 유성영화 시대에도 끝까지 빛나는 스타로 남아있던 배우이기도 하다.
파티에서 나누었던 꿈처럼 매니는 촬영 현장에서 일하게 되고 넬리는 스타가 된 1927년은 넬리의 모델이 된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인 클라라 보우가 <잇>으로 스타가 된 해이다. 영화에서 매니와 넬리는 뉴욕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려지는 넬리의 가정사는 실제 클라라 보우의 가정사와 많이 닮아있다. 그리고 1927년은 이야기한 것처럼 <재즈싱어>가 개봉한 해이며, 매니는 뉴욕에서 유성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보고는 잭에게 유성영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1928년부터는 잭에게는 길었던, 넬리에게는 짧았던 영화의 꿈이 사그라지는 해가 된다. 그들의 연기와 목소리는 새로운 영화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매니는 연출자로 인정받게 된다. 매니의 모델이 된 르네 카도나가 이름을 알리게 된 시기도 이즈음이다. <바빌론>에서는 매니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바탕으로 아무리 넬리를 다시 스타로 만들기 위해 뛰어도 넬리의 사그라져버린 꿈은 다시 피어나지 못하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잭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엘리노어가 말하는 것처럼 관객들의 외면에는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1929년은 최초의 뮤지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멜로디>와 같은 작품이 개봉했던 해이며, 이후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 같은 스타들이 탄생하며 뮤지컬 영화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꿈과 환상으로 사랑받는다. 그래서 <바빌론>에서도 잭이 ‘Singing in the rain’을 부르는 장면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실제로 1929년 개봉했던 <할리우드 리뷰 오브 1929>라는 영화의 장면을 재현한 것인데, 이 영화에 잭의 모델인 존 길버트가 출현하며, <할리우드 리뷰 오브 1929>에서 비를 맞으며 ‘Singing in the rain’을 부르는 바로 그 장면에는 무성영화 시대의 거장 감독이자 배우였지만 유성영화 시대가 열리며 단역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버스터 키튼도 등장한다.
이렇게 데이미언 셔젤은 실제 이야기들을 영화 곳곳에 심어놓으며 할리우드 황금기의 거대한 풍경화를 그려나간다. 그런데 그렇게 건설된 <바빌론>은 아름답기만 하지도, 환상적이기만 하지도 않다. 아주 지저분하고 지치고 절망적이며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 잭에게도, 넬리에게도, 살아남은 매니에게도 말이다. 많은 이들의 쇠락하는 꿈들을 딛고 빛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영화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바빌론>에서 그 영화는 <사랑은 비를 타고> 그 자체이다. 그래서 매니는 오랜 시간이 흘러 1952년 <사랑은 비를 타고>를 마주했을 때, 너무도 아름다워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사랑, 꿈, 세계, 모든 것을 짓밟고 건설된 영화는 자신이 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그대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바빌론>에서 영화는 사랑이고, 사랑은 영화다. 매니에게 넬리가 그렇듯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고, 놓아버린 뒤에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듯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그런 것, 너무나도 작아서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사랑하는 대상의 일부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은 그런 것, 사랑의 대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 <바빌론>의 직유법은 통할까? <바빌론>의 마지막 장면에는 3시간 동안 펼쳐진 열렬한 구애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영화사를 요약하는 몽타주가 강렬하게 펼쳐진다. 영화는 사랑이고, 사랑은 영화다. 영화가 가장 빛나던 시절을 그려내며 데이미언 셔젤이 하고 있는 절절한 고백은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슬프고 아름다운 환상을 펼쳐 보이며, 그래서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영화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적어도 영화가 열렬한 짝사랑을 바칠만한 위대한 사랑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기를. 그것이 무수한 이들의 꿈을 딛고 세워진 광기의 세계더라도 말이다.
- 다음글 영화 <컨버세이션>이 담아낸 대화의 일상성
- 이전글 한 전쟁의 역사 끝에서,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