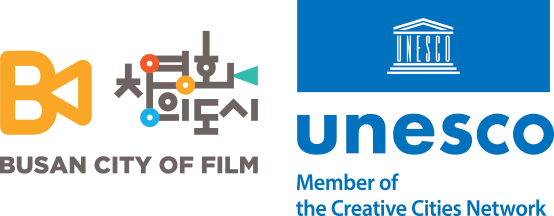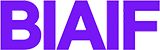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아득하고 흐릿한 시간들, <물안에서>2023-04-18
-

아득하고 흐릿한 시간들, <물안에서>
강선형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프루스트는 아무리 돌이켜보려 해도 되살아나지지 않는 과거의 시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지금 기억 속에서 다른 ‘스냅 사진’, 특히 베니스에서 찍었던 몇 가지 스냅 사진을 꺼내보려 하고 있지만, 베니스라는 낱말이 머리에 떠오르기만 하여도 내 기억은 사진 전람회처럼 권태로운 것이 되고 말아, 이미 아무런 흥미도 아무런 재능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리 과거에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아도 사진의 선명함이 우리의 기억을 지배해 버려서 과거의 그 풍부했던 시간들은 도무지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진첩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닷가 냄새가 베니스로 데려다줄지 모른다. 과거는 그렇게 문득 아주 생경하게 찾아온다.
홍상수의 스물아홉 번째 장편영화 <물안에서>는 감독의 유년기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물안에서>는 어쩌면은 ‘명예’라는 추상적인 성취를 위해, 어쩌면은 나의 창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한 돈 전부를 들여 찍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홍상수는 자신의 과거를 자기 앞에, 그리고 관객 앞에 세워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 과거는 프루스트가 말하듯이 선명할수록 권태로운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아득하고 흐릿하게 어느 유년기가 펼쳐져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영화의 흐릿함은 영화 내적으로는 더 여러 층위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아득하고 흐릿한 제주도 어딘가에서 영화를 찍기로 결심하는 승모(신석호)와, 그를 돕기 위해 내려온 상국(하성국)과 남희(김승윤)가 막연함 속에서 견뎌내는 시간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 선명하고 그들이 찍어야 하는 영화는 너무 흐릿하다. 하루하루 피자부터 샌드위치까지 메뉴를 정하는 일은 쉴 새 없이 찾아오고, 그것은 꼬박꼬박 돈이 드는 일이며, 그럴수록 영화는 수면 아래로 침잠한다. 그래서 무언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머뭇거리며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살 수 없을지 자꾸만 결정을 유예하는 승모의 마음도, 그런 승모를 옆에 두고 하릴없이 어쩌면 설렘일 수도 있는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상국과 남희의 마음도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또는 우리 인생이 모두 흐릿한 물 안에서 바깥을 혹은 물 밖에서 깊은 물속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도, 미래도, 어느 하나 선명한 것은 없기에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흐릿함 속에서 나아간다. 승모가 꿋꿋이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승모는 나아간다.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화라는 결과물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 승모가 상국과 남희에게 마지막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설명할 때 그처럼 아름다운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이다. 승모는 관광객들의 미혹의 세계 아래에서 부산물들을 묵묵히 치우고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를 계속 쫓아다니던 남자, 곧 자기 자신이 결국 여자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미혹의 세계로 다시 올라가고 싶지는 않아서 서성이다 바닷가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구상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이 될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승모를 상국이 촬영하는 마지막 장면은 마치 <베니스에서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처럼 슬프고 아름답다. 승모에게도 영화는 과거의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생겨난 노래를 아마도 중요한 사람이었을 누구에게 선물했던 과거의 자기를 흐릿함 속에서 떠올려 보는 것일 테다. 흐릿한 과거와 놀라운 현재가 만나고 그것은 미래의 영화가 된다. 모든 것들은 흐릿한 것을 들여다보며 선명해지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영화를 찍는다는 건 끝이기도 시작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승모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택하지만, 영화를 찍는 승모는, 그러니까 그가 하려고 했던 이 이야기처럼 온갖 미혹들로 둘러싸인 현실 세계에서 늘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를 바랐던 승모는, 영화라는 세계에 머물며 미혹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마야의 베일처럼 미혹의 세계는 늘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지만, 영화와 함께 그는 수면 아래로, 또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세계이다. 영화만이 진정한 구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죽음 앞에서 그를 멈춰 세우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것은 영화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물 안에서>는 흐릿함 속에서 영화에 바치는 절절한 고백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흐릿함 속에서도 그토록 아름다운 건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 다음글 절망과 실망, 희망이 혼재한 영화 <제비>
- 이전글 <차별> - ‘조선’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재일 동포들의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