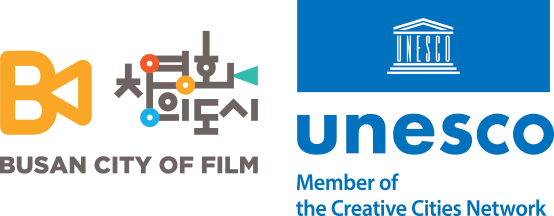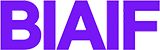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로운 시선

영화로운 시선은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업으로 탄생한 '시민평론단'에게
영화에 관한 자유로운 비평글을 기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부산 시민들이 영화 비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활발한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개봉하는 대중영화와 한국독립영화를 바탕으로 게시되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말이야 바른 말이지>: 못난 말들의 난장판2023-05-23
-

<말이야 바른 말이지>: 못난 말들의 난장판
김현진 (시민평론단)
여섯 편의 단편영화를 묶은 옴니버스 영화 <말이야 바른 말이지>는 소셜 코미디를 표방한다. 하나로 한정된 공간, (동물을 포함해서) 셋으로만 제한된 배우들이라는 조건 속에서 여러 사회적인 의제들을 품은 대화의 향연이 감독들 각자의 방식으로 펼쳐진다.

윤성호 감독이 연출한 <프롤로그>에선 대기업 과장과 중소기업 사장 사이의 외주 용역 계약의 풍경이 그려진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서로 ‘후려치기’의 요령을 뽐내는 중이다. 대기업에선 하청 직원들의 임금 단가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 중소기업에선 (그게 나쁘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외주 일을 따내는 것이 좋은 거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지만 서로를 한심해 하고 있다. 김소형 감독이 연출한 <하리보>에는 반려동물과 주거의 문제를 다룬다. 이별을 앞둔 동거 커플이 같이 키우던 고양이 ‘하리보’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놓고 옥신각신한다. 남자와 여자는 고양이가 누구를 더 따랐는가를 놓고서 마지막 내기를 벌인다. 고양이의 마지막 표정이 기가 막힌다. ‘너네 뭐하니?’라고 묻는 듯한 그 오묘한 표정. 박동훈 감독이 연출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에서는 지역 혐오 문제와 계급 혐오의 문제를 그린다. 차별이 두려워 평생을 전라도 출신임을 쉬쉬하며 살아온 아버지는 만삭의 딸이 광주에서 출산하겠다는 것이 못마땅하다. 딸은 아버지가 못마땅하다. 시대는 변했고 지역 차별 감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딸. 시대는 변했으나 차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다.

최하나 감독이 연출한 <진정성 실전편>에선 GS25 남성혐오 논란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른바 ‘남혐’ 용어에 꼬투리 잡혀 괴로움에 처한 두 여성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애견 교육센터의 팀장과 직원은 불매 운동에 대처하기 위한 사과문을 작성하느라 괴롭다. 이른바 남혐 용어라고 하는 ‘허버허버’를 떠올리게 만드는 ‘허버버법’이란 말을 기업 홍보문구에 넣은 죄로 퇴사당한 여자 직원. 그녀를 대신해서 그들은 ‘허버버법’이 왜 남성혐오 용어인지, 왜 불매운동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수습해야만 한다. 죄짓지 않았는데도 사죄를 해야 하는 웃픈 풍경. 송현주 감독이 연출한 <손에 손잡고>는 프로포즈 이벤트를 하는 남녀 커플의 닭살 돋는 풍경이 펼쳐진다. 독실한 종교인 남자와 무신론자 여자는 과연 프로포즈에 성공하고 결혼을 하게 될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둘이 남기고 간 것들이다. 한인미 감독이 연출한 <새로운 마음>은 서늘하게 직장 내 성추행을 다룬다. 유부남인 팀장은 독신 여성인 대리에게 과거에 몹쓸 언행을 저질렀다. 혹시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폭탄이 될까봐 불안한 팀장은 대리를 회유하기 위해 애쓴다.
‘현타 온다’는 말이 있다.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다. 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같은 감정이 들 때 쓰는 말이다. 영화 <말이야 바른 말이지>를 보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 <손에 손잡고> 속 연인의 프로포즈 이벤트가 끝나고, 혼자 남은 이벤트 회사 직원이 그들이 남긴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바라보는 장면. 그 사람이 지은 표정이 바로 현타 온 표정이다. 이는 이 영화를 보게 될 관객들이 마주하게 될 감정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온갖 못난 쓰레기 같은 말들의 난장판. 그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 그렇게 <말이야 바른 말이지>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현타를 안겨준다. 말 그대로 현실 자각 타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다.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는다. 혹시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언행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가. 온갖 차별과 혐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언행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결백한가.
- 다음글 <그 여름>: 사랑의 여름과 깨달음의 여름
- 이전글 <사랑의 고고학> : 길고 느리고 끈질기게, 상처를 치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