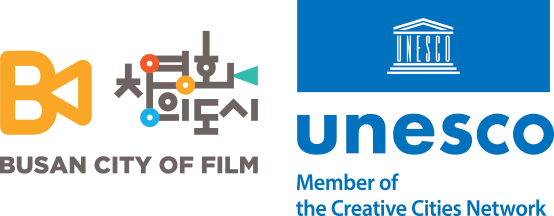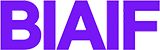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 시네마의 마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플라워 킬링 문>2023-10-30
-

시네마의 마법을 되찾을 수 있을까, <플라워 킬링 문>
강선형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몇 년 전 마틴 스코세이지는 펠리니에게 「펠리니와 함께 시네마의 마법이 사라지다」라는 헌사를 바치며 말했다. 오늘날 영화 예술은 ‘콘텐츠’에 밀려나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는 십여 년 전만 해도 ‘콘텐츠’라는 말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항으로 영화를 분석하고 영화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나 들을 수 있는 단어였다고 회고하면서, 점차 ‘콘텐츠’라는 말이 독자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예술형식의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들이 미디어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겨난 변화이다. 이제 ‘콘텐츠’라는 말은 영화사에 기록될 고전적 영화에도, SNS에 올라오는 쇼츠에도, OTT 채널에 공개되는 드라마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역시 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영상 매체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용어”가 콘텐츠다.
그 자신도 벌써 OTT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영화를 공개하고 있는 스코세이지이지만, 그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09분의 넷플릭스 제작 <아이리시맨>, 206분의 애플 제작 <플라워 킬링 문>, 상영 시간만 보더라도 자유로운 제작 환경을 보장하면서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OTT 채널이 그에게 이롭지 않을 리 없건만, 그는 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이는 이미 시청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의 ‘제안’에 따라 시청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마주치기 위해 영화관이라는 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낯선 것이란 건 없고 익숙하고 낯익은 것들의 향연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조회수, 관객 수, 손익분기점과 같은 것들로 ‘콘텐츠’가 평가된 지 오래건만, 우리에게 오늘날의 영화 예술이 처한 위기가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가올까? 그것은 이 위기가 수치화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수치만 회복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위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이 더 이상 사유의 충격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스코세이지는 영화가 ‘시네마’였던 시절, 그리고 마법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것을 길거리를 헤매며 낯선 인간들을 마주하는 것에 비유한다. 낯선 사람들의 얼굴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카사베츠의 <그림자들>, 샤브롤의 <사촌들>을 거쳐, 펠리니의 <달콤한 인생>, 베리만의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트뤼포의 <피아니스트를 쏴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화의 경험이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내가 그런 시절에 살았고, 그 시절에 젊었고, 그 모든 것에 열려 있어서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언제나 ‘콘텐츠’ 그 이상이었다.” 영화의 거장들이 사라지고, 낯선 이름이 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 거장의 이름들을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 시절을 살았다는 것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여든의 스코세이지가 이토록 정교하게 만드는 영화를 여전히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그가 하는 우려는 “영화를 돌보기 위해서 더 이상 오늘날처럼 영화산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취향 저격 알고리즘은 단지 ‘큐레이팅’을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추천 중인 수십 개의 영화들이 화면을 차지한 가운데 단 한 칸도 완전히 낯선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코세이지가 수영장의 레인에 비유하는 것처럼 ‘예술 영화 애호가’로서 ‘예술 영화’라는 라인에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술 영화가 노출될 기회는 없다. 그래서 그는 영화들이 더 이상 “이용당한 다음에 창고에 처박히는 단순한 재산”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화를 불러일으키고 영화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플라워 킬링 문>은 <아이리시맨>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오늘날의 낯익은 문법으로, 빠르게 사건의 연쇄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시절에 그가 사랑했던 영화들처럼, 그리고 모든 이가 사랑했던 그 자신의 영화처럼 영화를 만든다. 사람들이 맥락을 떼어와 그에게 비난을 가했던 발언, 마블 시리즈와 같은 히어로 영화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와 같으며, 필름 프랜차이즈에 불과하다고 했던 그 발언에 책임을 지듯이, 그는 모든 인간들의 감정과 격동들을 세세하게 전달하며 영화를 만든다. 인디언들 옆에서 ‘친구’로서 오랜 세월을 보면서도 결코 그들 앞에서 실없이 떠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윌리엄 킹 헤일(로버트 드 니로)의 무표정한 가운데서도 경고와 위협을 보내는 눈동자를 담아내고, 사건을 봉합하기보다는 끝도 없이 일으키기만 하는 어니스트 버크하트(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끝내 모든 것을 깨닫는, 너무 늦게 깨달아버려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마저도 깨닫는 얼굴의 근육들을 담아낸다.

몰리 버크하트(릴리 글래드스턴)는 어떤가? 어머니와 자매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는 총명한 얼굴, 시간을 들여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 얼굴이 우리에게 인디언의 역사와 함께 거대한 슬픔을 가져다준다. 스코세이지는 이 세 사람의 감정과 격동을 단순화하지 않고 복잡한 그대로 전달하고, 이것이 우리가 늘 미지의 영화를 마주하면서 기대했던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낯선 타인의 감정을 격렬하고 치열하게 경험하는 것 말이다. 게다가 스코세이지는 주인공들, 즉 ‘히어로’인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의 온갖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그들에게 사건을 끌고 가는 내레이션을 맡기기까지 하며 시대의 상을 그린다. 인디언들과 백인들이 뒤섞인 복잡한 기차역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백인들의 눈빛들을 담아내는 장면은 영화의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압도적인 장면이다. 그러한 백인들의 군상은 제의적인 축제를 벌이는 인디언들의 마지막 장면과 겹쳐지면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을 낳는다.

문제가 되었던 스코세이지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그에게 ‘취향’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블 시리즈를 사랑하는 것도 취향이고, 스코세이지를 사랑하는 것도 취향이며, 두 취향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취향이 일방향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정말로 취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취향을 ‘저격’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면 그것을 취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스코세이지의 질문은 그런 것이다. 차이를 잃어버린 다양화, 그것이 문제이다.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영화가 시네마의 마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한 영화가 모든 것들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스코세이지는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시네마의 마법은 처음부터 ‘마법들’이었고, 우리는 마법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든지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타인이 되는 그런 마법들 말이다. 시네마의 마법들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스코세이지와 함께 바라 본다.

- 다음글 영화 <너를 줍다>가 던지는 질문과 고민, 과연 어디까지일까?
- 이전글 영화 <30일>이 3,000일을 담아내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