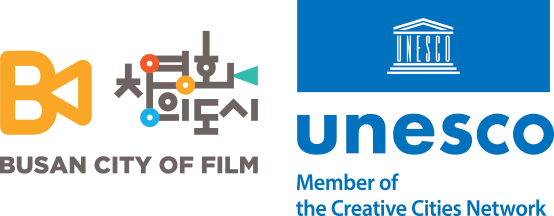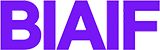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 역사를 증언하기, <돌들이 말할 때까지>2024-04-26
-

역사를 증언하기, <돌들이 말할 때까지>
강선형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양농옥, 박순석, 박춘옥, 김묘생, 송순희, 이 다섯 할머니의 4·3 사건 당시의 증언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다. 할머니들은 여전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여기저기 맞고, 고문당하며, 군사재판을 받아 이리저리 끌려다닌 기억들을 끌어낸다. 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모두 끌려가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끌어안고 매를 맞아야 하던, 고작 20대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겪었던 기억들을, 울분을 터뜨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모자랄 판에, 70년이 지난 뒤에도 또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증언한다. 시달리고 버티며 움직이고 깨어나는 제주의 자연처럼 할머니들의 시간은 멈춰있으면서 나아간다.

형무소에서 두 아이를 잃고 남편의 소식을 몰라 재가해야 했던 이야기처럼 다섯 할머니의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증언은 그 자체로도 슬픔이지만,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 친척들, 이웃들, 도민들의 이야기로 확대된다.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사 전체의 증언이기도 하다. 영화는 그들이 당했던 폭력과 고문, 재판과 수감,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을 담담하게 전하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한 뒤, 수형인들의 재심과 결과를 보여주는데, 기쁨 속에서도 늘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은 ‘아우슈비츠’를 연구하면서, 증언할 수 없는 것의 증언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미 죽은 자, 사라진 자, 그래서 증언할 수 없는 자들의 역사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프리모 레비는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에서 나치 친위대의 경고에 관해 쓴 바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언정 너희들에 대한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다. 너희들 중 누구도 살아남아 증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설령 누군가 살아남게 될지라도 세상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증거들도 죄다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악의로 가득 찬 잔인한 말은 역사를 폭력으로 물들인 자들이 늘 기대하는 바이다. 기록이 없으면, 그리고 증언할 자들이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으면, 언젠가 역사는 승리의 기록을 써 내려가는 자들의 편이다. 이승만 정부의 공과 과를 함께 이야기하기, <돌들이 말할 때까지>에서 할머니와 자식들이 말하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지 않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이 증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증언을 기록하고 증언 너머를 기록하기,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가?

아감벤은 아우슈비츠에서 ‘무젤만(der Muselmann)’이라고 불린 자들을 이야기한다. 모든 삶의 의지를 상실한 무력한 형상은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 영역에 있던 그들의 삶을 살아남은 자들이 온전히 증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아감벤은 오히려 증언 가능성은 그들의 ‘말할 수 없음’으로부터만 온다고 말한다. 증언이라는 것은 증언 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잠재적으로 증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잠재성은 늘 증언되지 않을 수 있음과 함께 있음으로써만 잠재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성은 잠재적이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이 잠재성의 영역을 경계 지어줌으로써만 잠재성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언 불가능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증언 가능성은 실제로 증언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증언이 어떤 비잠재성을 통해서만 말함의 잠재성의 발생을 증언하는 한’ 증언은 가능한 것이 된다.

돌들이 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은 그 자체로 현실화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을 가능하게 하는 증언 불가능성, 즉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이 기록되고 사후적으로나마 보상됨으로써, 증언될 수 없고 기록될 수 없었던 이들의 역사까지 기록되는 것 말이다. 그러므로 증언을 위해서는 언어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과의 관계 안에 갇혀서는 안 되고, 오히려 비언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비언어가 된 언어는 증언의 불가능성을 통해서 증언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감벤은 증언의 언어는 더 이상 의미를 띠지 않는 언어이고, 언어를 갖지 못한 언어이며, 무의미를 띠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언어라고 말한다. 우리는 말함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것에 닿는 것이다. 돌들을 말하게 하는 일, 시달리고 버티며 움직이고 깨어나는 제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증언하고, 기억하는 일은 바로 그것과 같다. 우리는 다섯 할머니들의 ‘슬픔의 권능’ 속에서 거대한 역사의 권능을 본다.

- 다음글 <정순> - 호모소셜 사회에서 중년 여성으로 살아남기
- 이전글 사색과 산책을 부르는, 긴 여운의 영화 <땅에 쓰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