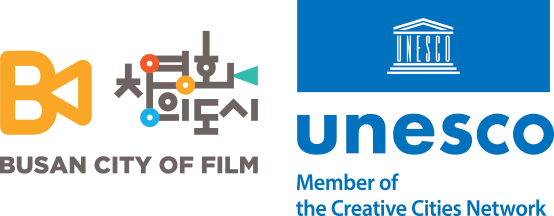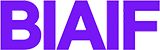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물드는 삶, <한국이 싫어서>2024-09-10
-

물드는 삶, <한국이 싫어서>
강선형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당신의 친구가 한국이 싫어서 떠나겠다고 하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결혼을 약속한 계나(고아성)를 떠나보내야 하는 영화 속 지명(김우겸)처럼, 내 일이 아니라서 그저 몇 마디 응원이나 부러움을 표시하거나 허황된 꿈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지명처럼 간절히 붙잡아두면 한국에 물들어 시들어버릴 것 같고, 떠나보냈을 때 그 또는 그녀가 찾은 행복이나 불행은 모두 슬플 것이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결코 찾아질 수 없는 행복이고, 또 불행이었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단지 무모함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간절히 달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계나를 보면 그런 마음이 인다. 단지 ‘모두 다 그렇게 살아, 특별할 것 없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도 말할 수 없는데, 고향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 같은 것.

일종의 고향 찾기 같은 계나의 여정은 한국을 떠나 한국과 비슷한 곳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국을 떠나며 끝난다. 한국을 떠날 때는 부의 대물림, 차별과 문화와 관습의 강요들이 있다. 그것들은 너무 공기 같아서 금세 익숙해져 버리는 것들이다. 주변의 몇몇 사람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도, 거대한 사회도 바꿀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다가는 영영 물들어서 다시는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계나를 도망치듯 떠나게 만든다. 그런데 한국을 떠나 도착한 뉴질랜드는 한국과 비슷하다. 여전히 계나는 한국인으로서 사람을 만나고, 한국과 비교하고, 때로는 한국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한국을 떠나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평가하고 평가받는다. 자기 자신도 ‘한국 남자애들’을 규정짓고, ‘한국’을 규정짓고, ‘여기 오는 한국 사람들’이라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한국에서 지명에게 들었던 ‘한국에 오는 동남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인도네시아 남자 친구 리키(모건 우이)에게 또 듣는 것이다. ‘여기 오는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갔겠지.’ 그리고 계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한국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고 있으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죽음에 이르고 만 경윤(박승현)이 그것을 말해주고, 어느새 직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 표정을 얻은 지명이 그것을 말해주고, 경윤에게 받았던 나침반 희망 굿즈의 주인인 채복희(정이랑)의 죽음도 그것을 말해준다. 한국뿐인가. 뉴질랜드에서 계나를 도와주었던 가족들도 모두 죽었다. 행복이나 희망 같은 건 원래 ‘찾는 것’이 아니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고향도 원래 ‘찾는 것’은 아닌 것 아닐까?

그러니까 행복도, 희망도, 고향도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디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그러니까 한국도 괜찮아’로 귀결되지 않고 ‘어디든 괜찮아’로 귀결된다. 떠날 때처럼 캐리어 가득 쑤셔 넣는 짐이 아니라, 한국을 다시 떠나며 등산 가방에 쑤셔 넣는 짐은 그러니까 가볍고, 그래서 희망적이고, 행복하고, 고향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계나에게 고향을 찾아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은 함께 공기 중에 흩어진다. 더 이상 뭔가가 되려고 떠나지 않으니까, 한국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여정은 이미 고향에 도착했다.

물들지 않는 삶, 계나의 선택은 그것이었다. 한국에 살면서 물들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계나의 동생 미나(김뜻돌)처럼, 밤새 게임하고 알바만 하며 살면서 ‘비주류’만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물들지 않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계나는 물들지 않을 수 없고,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래서 훌훌 떠난다. 그러니까 그저 물들지 않는 삶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어떤 삶이든 가치 있다. 계나는 뉴질랜드에 도착해 몇 년이 흘러서야 무채색의 옷들을 벗어 던지고 다양한 색을 온몸에 입는다. 미나는, 그리고 재인(주종혁)도 처음부터 다양한 색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계나는 차가운 겨울이 봄으로 바뀌듯, 자신의 색을 입어 나가는 것이다. 그건 한국의 색도 아니고, 뉴질랜드의 색도 아니고, 그저 계나의 색일 것이다. 그것은 학벌도, 직업도, 어떤 브랜드같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녀가 고군분투 끝에 얻어낸 색채다.

- 다음글 <딸에 대하여> - 서로의 세계가 겹쳐지는 순간에 깃드는 작은 빛
- 이전글 [6월 피프레시 원고]피프레시 월요 시네마-<추락의 해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