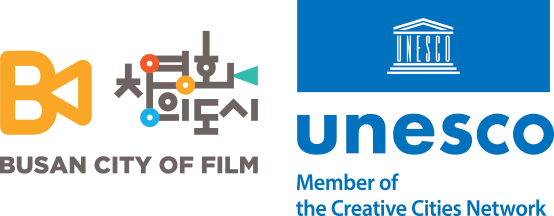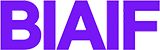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김경욱의 영화사회학

영화사에서 기획과 시나리오 컨설팅을 했고,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영화평론가로 글을 쓰면서 대학에서 영화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영화평론가협회 기획이사로 활동 중이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에 「김경욱의 시네마크리티크」를 연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블록버스터의 환상, 한국영화의 나르시시즘』(2002), 『나쁜 세상의 영화사회학』(2012), 『한국영화는 무엇을 보는가』(2016), 『영화와 함께 한 시간』(2022) 등이 있다.
- 작아지던 뒷모습처럼 멀어지고 사라질 - <장손>2024-09-20
-

작아지던 뒷모습처럼 멀어지고 사라질 - <장손>
송아름(영화평론가)
* 영화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흐릿한 화면, 도무지 이 답답함이 언제까지 갈까 궁금해질 즈음 드러나는 두부 공장의 모습은 영화 <장손>이 그려낼 ‘장손’의 흐릿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지 모른다. 사실 장손이 지닌 흐릿함은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장손은 ‘한 집안에서 맏이가 되는 후손’으로 정의되고 있어 어떠한 남성적 표지도 찾을 수 없으며, 그럼에도 ‘맏손자, 적장손, 큰손자’ 등의 용어와 유사하기에 남성에게 쓰는 표현이라는 국립국어원의 정리는 ‘맏이’, ‘적장(嫡長)’, ‘큰’ 과 같이 첫째나 가장 연장자를 가리키는 표현을 만족시키지 않았음에도 아들을 ‘장손’으로 대우하던 오랜 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애매한 정의 사이를 헤매다 정착한 장손의 뜻은 순서는 어떠하든 간에 ‘한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특정 성별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의미의 모호함이야 어떻든 간에 특권의 지표는 너무도 뚜렷했기에 오랜 시간 이 ‘특권’의 불합리가 자주 비춰졌다. 장손 외에 소외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어이없는 일까지 있었는지, 기대와 기댐이 얼마나 당연하게 각기 다른 성별의 자식 혹은 손주에게 부여되었는지 등은 어느 집에서나 찾을 수 있는 닳고 닳은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도달한 <장손>은 더 이상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거리하며 뻗대는 반항을 그리지도 않았다. 아들을 안타까이 챙기는 부모에 대해, 손자만 시원한 바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 할머니에 대해 딸들도 손녀도 새된 소리를 하지 않았고, 살가운 손자는 집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러한 대가족 집안의 분위기를 잡아내며 <장손>이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듯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더 이상 특별한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장손의 무게는 스스로 문제를 드러냈다. 모두가 적응했지만 적응하지 못한 채, 누구도 씌우지 않았지만 스스로 짊어진 그 무게. <장손>은 바로 이것으로 몰락해가는 장손들을 그려내고자 한다.

이 집안의 장손인 할아버지 승필(우상전)과 아버지 태근(오만석)은 각 세대를 대변하며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윗세대의 아집을 그대로 펼쳐낸다. 승필은 식민지시기에서 6.25를 겪어가면서도 살아남은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소중한지를 되뇌이지만 이는 과거에 갇힌 승필의 기억 속에서만 빛날 뿐이다. 이제 디펜드를 챙기지 않으면 외출이 어렵고 치매가 가까워진 승필은 이 과거의 기억을 잡고 집안을 이어갈 손자를 챙기며 쪽바리와 빨갱이가 이 집안 누구에게도 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으로 집안을 지키고자 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처로 다리를 절게 된 태근 역시 그리 다르지 않다. 태근은 그때의 울분을 고스란히 지닌 채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누군가에게 발작처럼 화를 내고 분을 이기지 못해 넘어간다. 과거의 공포에 갇혀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태근은 바로 이 억압으로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아들에게도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이렇게 승필과 태근이 쌓아간 집은 겉으로 안정돼 보였지만 작은 돌 하나만으로도 그 바닥을 드러내며 엄청난 파장에 휘청댔다. 이 집안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두부 공장을 더 이상 손주 성진(강승호)이 맡지 않겠다고 나서거나, 말녀(손숙)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둘 밝혀지는 가족들의 본심은 더 이상 이 두 세대가 집안을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촘촘히 드러낸다. 멀리 미뤄놨던 감정들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이제 가족들의 균열은 명확해지고 오랫동안 유지된 특권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이었는지를 생각게 한다. 특히 집을 나서려는 성진에게 승필이 건넨 통장에서 혜숙(차미경)이 억울한 듯 이야기하던 바로 그 금액이 확인될 때 장손들을 위한 집안이 얼마나 잔인하게 꾸려져 왔는지, 그리고 그 짐이 또 다른 세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지 역시 돌출되며 이 집안의 몰락를 그리게 된다.

영화 <장손>은 언제 어디선가 분명히 본 듯한, 아니 보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한 가족을 고스란히 옮겨 놓는다.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모인 제삿날이나 장례식의 풍경, 오고 가는 센 사투리는 분명 어디서 들어본 듯 익숙하고 잘 아는 듯 서로를 챙기면서도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내가 겪었던 기류인 듯 낯익다. 스크린 속 북적대며 움직이는 인물들과 누군가의 목소리를 덮는 또 누군가의 목소리들, 이를 긴 호흡으로 잡아내는 카메라는 장손에 대한 애증이 이젠 더 이상 문젯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당연하게 녹아들고 또 누적된 한 가족의 모습을 비추는 데에 효과적이다. 마치 이 가족의 세월을 함께하다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인물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전사(前史)를 추적하는 데에, 가시 돋친 원인을 알아내는 데에 딱맞는 힌트로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 익숙함, 그러니까 너무나 알 것 같아 마치 내 일인 듯 빠져드는 이 친숙함은 이제 더 유지될 수 없어 끝자락에 매달린 장손들에게 연민을 보내게 한다.

승필과 태근이 쌓아온 장손들의 집은 이제 기울어 버렸다. 이를 짐작한 듯 성진에게 통장을 건네고 산으로 올라가는 승필의 뒷모습은 많은 생각들을 남긴다. 롱 테이크로 담아낸 승필의 마지막은 그 후를 짐작할 수 있기에 안타깝기도, 또 변해버린 집안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는 그 고집스러운 선택에 야멸차보이기도 하다. 설사 승필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더 이상 현재에 머물지 못할 것이며, 이를 향한 태근의 울분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니 어쩌면 과거를 지키고 싶은 최후의 선택으로 적절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점처럼 작아져간 승필의 모습처럼 그 대단한 장손의 흐름은 이제 넓게도 멀리도 흐르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짧은 화목을 사진 속에만 담았던 것처럼 장손 역시 잠깐의 박제를 지나 곧 흩어질 테니까.

- 다음글 분명, 우리는 응원받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다큐 <마녀들의 카...
- 이전글 <그 여름날의 거짓말>, 혹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