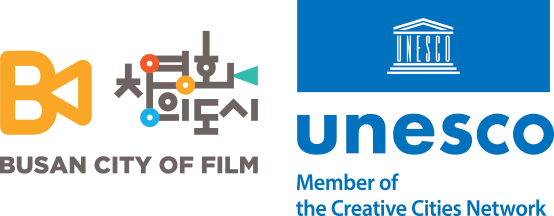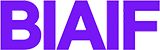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김경욱의 영화사회학

영화사에서 기획과 시나리오 컨설팅을 했고,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영화평론가로 글을 쓰면서 대학에서 영화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영화평론가협회 기획이사로 활동 중이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에 「김경욱의 시네마크리티크」를 연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블록버스터의 환상, 한국영화의 나르시시즘』(2002), 『나쁜 세상의 영화사회학』(2012), 『한국영화는 무엇을 보는가』(2016), 『영화와 함께 한 시간』(2022) 등이 있다.
- ‘네 가지 색’ <미망>2024-12-02
-

‘네 가지 색’ <미망>
김경욱(영화평론가)
김태양 감독의 <미망>은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붉은색 화면에, ‘미망(迷妄):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어느 여름에 여자(이명하)와 남자(하성국)는 을지로3가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다. 예전에 연인이었던 여자와 남자는 청계천, 동묘 시장, 광교, 종로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여자의 목적지인 서울극장 근처에서 두 사람은 쿨하게 헤어진다. 그러나 담배를 끊었다고 했던 남자가 담배를 사서 피우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 미련이 남은 듯이 보인다. 하지만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오자 미련을 떨치려는 듯 담배와 라이터를 버린 다음 그녀를 만나러 간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녹색 화면에, ‘미망(未忘):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다’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여자는 서울극장에서 박남옥 감독의 영화 <미망인(未亡人)>에 대한 토크를 진행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팀장 남자(박봉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하고 여자는 망설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헤어진다. 동생에게 전화 거는 장면을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는 것 같기도 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흥미로운 점은 차이와 반복이다. 여름 낮이 늦봄의 밤으로, 여자 혼자 담배 피던 장면이 여자와 남자가 같이 담배 피는 장면으로, 여자의 벽돌색 원피스가 하늘색 원피스로 바뀌었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이 걸었던 길을 두 번째 에피소드의 두 사람도 걸어간다. 간간이 비가 내리는 날씨에 두 남자는 똑같이 빨간 우산을 들고 있다. 그리고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과 그에 관한 이야기 등이 반복된다.
파란색 화면에 ‘미망(彌望): 멀리 넓게 바라보다’는 자막으로 시작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여자와 남자(하성국)는 여러 해가 지나고 난 겨울에 두 사람 모두와 가까웠던 친구 정수(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이름)가 세상을 떠나 문상하러 갔다가 다시 마주친다. 그들은 후배의 택시를 타고 밤에 광화문에 도착한다. 예전에는 남자에게 애인이 있었고 여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혼자이고 여자는 두 번째 에피소드의 남자를 만나고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던 남자는 화가로 자리 잡은 상태다. 서로를 향한 모호한 감정을 뒤로하고 이번에도 두 사람은 다시 쿨하게 헤어진다. 여자가 후배의 택시를 타고 떠나가고, 남자는 혼자 버스를 타고 졸다가 예전에 여자와 함께 걸었던 거리에서 하차한다. 그리고 ‘미망(微望) 작은 바람’이라는 자막이 떠오른다. 네 번째 자막으로 등장한 ‘미망’은 사전에는 없는, 한자의 조합으로 의미를 만들어낸 단어이다. 감독이 ‘미망’을 영화의 제목으로 결정했을 때, 생각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네 가지 다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미망’이었을까? 그렇다면 ‘작은 바람’은 무엇일까?

이 영화에서 인물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그들을 여자와 남자로 부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이와 반복 속에서 여자가 만난 두 명의 남자가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건 아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돌고 도는 세상의 쳇바퀴 속에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에피소드가 있다면, 여자와 남자(하성국)는 또다시 우연히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그들이 다시 연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추억과 기억 또는 망각 속에서 또다시 쿨하게 헤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세상이 돌고 돈다고 하지만, 삶의 비극성은 시간의 불가역성 속에서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때로는 정수처럼 삶을 마감함으로써 세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영화에서 인물들은 을지로에서 광화문까지, 서울의 중심가를 반복해서 걸어 다니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똑같은 데인데 다른 곳 같다”고 말하듯이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서울극장이 사라지고 세운 상가 건물이 철거될 거라고 여자와 남자가 언급했듯이, 서울은 여전히 건물이 부숴지고 새로운 건물이 생겨나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다.

남자가 버스에서 내린 다음, 카메라는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승객이 하나도 없는 버스 뒷자리에 머문다. 이때 관객은 카메라와 함께 인물들이 모두 사라진 텅빈 공간에서 그들이 남긴 자취를 더듬는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미망’ 속에 남겨진 것처럼.
- 다음글 집 한 채를 지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 영화 <한 채>
- 이전글 <보통의 가족>,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