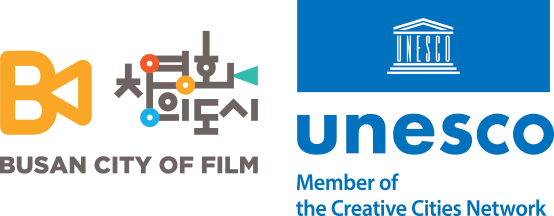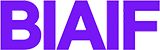영화MOVIE
영화평론가 비평

영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 다양한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평론가' 차별화된 평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평론글로 여러분을 새로운 영화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 서머 스페셜 2019 <몽파르나스의 연인>2019-07-29
-

<몽파르나스의 연인>의 오롯한 완성과 우아함에 대해
장지욱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영화의 시작은 어느 레스토랑에서 모딜리아니가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림 값으로 자신과 주변의 술값을 치르려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하나의 구도를 짐작케 하는데 전면에는 그림 모델이 되어주는 노동자가 있고 모딜리아니와 지브로가 그를 마주보고 앉았으며 모딜리아니의 뒤, 유리문 너머로 화상 모렐이 그의 스케치를 주시하고 있다. 모딜리아니를 중간에 두고 전면과 후면에 배치한 다른 인물들로 인해 이들의 자리는 직선상에 놓이는데, 이 구도는 레스토랑이라는 넓은 공간 안에서 모딜리아니에게 허락된 공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그를 압박한다.
베아트리체와 댄스홀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가게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나 모딜리아니의 첫 전시회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갤러리 안에서 융화되지 못하고 쟌느와 다른 방에 머물다 가게를 나가는 장면 등 <몽파르나스의 연인>(1958)에서는 넓은 공간 속에서 모딜리아니의 공간을 제한적이거나 폐쇄적으로 허락하면서 조명 받지 못하고 사교적이지 못한 그의 삶을 묘사한다. 반면에 화실에서 모딜리아니가 쟌느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역시나 제한되게 허락된 공간이지만 다른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다. 앞선 장면들과는 달리 모딜리아니는 습작생들이 모여 앉은 한 가운데 자리하고 그가 목탄을 찾자 뒤에 앉은 쟌느가 자신의 것을 건네는데, 습작생들을 차례로 지나 모딜리아니에게까지 다다르기까지의 횡으로 이동하는 카메라 워킹은 좁게 붙어 앉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여유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숏이다.
유사한 공간 안에서 인물과 상황에 따라 어떤 정서를 끄집어내는가에 대한 자크 베케르의 고민은 <몽파르나스의 연인>을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목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예술가와 그의 뮤즈, 타올랐다 사그라진 어느 불꽃같은 삶에 대해, 마땅히 아름다우나 오늘에도 대상을 달리해 진행 중인 이른바 비운의 예술가 서사를 마주하는 것 이상으로 <몽파르나스의 연인>은 그리고 자크 베케르는 고전적 서사의 관습을 넘어서거나, 쇄신하는 방식으로 그만의 영화를 쌓는다. 쟌느와의 하룻밤이 지나고 그녀를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복도 계단 난간을 짚고 선 채 아쉬워하는 제라르 필립의 미련 가득 묻어나는 아쉬움이며 창밖으로 쟌느와 손 인사를 나누는 숏에서 골목을 한가로이 지나는 마차와 소리는 아늑하지만 이어진 숏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쟌느를 발견하고 다급히 대화를 나누는 식구들과 쟌느가 들어선 골목에서 때마침 바쁘게 빠져나가는 자동차와 소리는 긴장을 고조시킨다. 영화에 차곡차곡 쌓아둔 정확한 구도와 섬세한 대비, 그 차이를 도식적이지 않게 연결하는 카메라의 완숙함은 이 영화의 미덕이다. 자크 베케르는 전에 없었던 것을 시도하거나 실험하지 않더라도, 전형적 서사구조 안에서도 관성의 범주 안에서 구도와 대비를 사용해 시간과 리듬으로 충만해지는 세계로 초대할 수 있다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 같다.
영화를 보고나면 슬쩍 이 영화를 말하기 위해 ‘우아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몽파르나스의 연인>에게 붙이는 수사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서 이 영화에 다가서는 것이 좋을지 (꼼꼼하게 펼쳐놓은 세계를 유영한 뒤여서일까.) 새삼 차려야 할 예의처럼 정중하게 전하고 싶어진다. 어쩌면 우아함이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것. 표현함에 있어서 선동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을 것. 그러면서 전할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것. 앞서 나열한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것에 애정을 깃들 것. 그 애정은 보내는 자에게서 그치는 것인 아니라 받는 이도 감화할 수 있을 것. 그리하여 내가 이 영화를 통해 감화되고 되돌려주고 싶은 ‘우아함’이란 모딜리아니를 빌어 말하자면 최초와 최고, 걸작과 거장을 반추하는 시대의 한 귀퉁이에서 무심하게 홀로 서있는 ‘오롯한 완성’에 대한 존경이다. 그제야 영화 속 모딜리아니의 초상화들은 경쟁과 성공의 가치에서 빗겨서 있었고 평가와 동정도 거부하는, 누군가 모딜리아니의 모델이 되어주었다면 그것으로서 오롯이 그의 캔버스에서 완성된, 표정도 눈빛도 심지어 눈동자도 선뜻 먼저 나서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 우아함으로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된다. 심지어 모딜리아니의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각인되는 순간이 이 영화의 엔딩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시금 첫 장면을 떠올려보자. 모딜리아니를 가운데 두고서 그와 마주했던 노동자, 그리고 모딜리아니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뒤로는 그를 지켜보던 화상 모렐이 있었다. 영화의 마지막, 모렐은 모딜리아니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의 죽음을 최초로 확인한 후 그 즉시 모딜리아니의 집을 찾아가 그의 그림을 모두 사겠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인정받고 격려받기를 바랐다며 울먹이는 쟌느의 얼굴과 그녀를 바라보는 모렐의 무표정한 얼굴, 이어지는 장면에서 거침없이 그림을 챙기는 모렐의 동작으로 영화는 끝난다. 반복적으로 그림을 챙기는 모렐의 동작은 이 영화 전체를 놓고 보아도 가장 역동적인 장면이고 개인적으로는 손에 꼽히는 영화의 엔딩이라고 말하고 싶다. 모딜리아니의 초상화가 유사성을 쫓지 않는 화풍이었듯 <몽파르나스의 연인>에서 자크 베케르 역시 추동성으로써 서사의 관습적인 완결을 변주하고자 했던 것일까? <몽파르나스의 연인>의 스토리는 모딜리아니의 죽음으로 완결되지만 이 역동적인 숏을 통해 영화는 추동하는 이미지로써 지속된다. 관습의 세계를 탐미하던 끝자락에 영화는 우아하게 추동해 나아가고 나는 여전히 이 오롯한 완성의 지점에서 머무르는 중이다.
- 다음글 거장의 예외적 영화들 <바다의 침묵><몽상가의 나흘 밤>
- 이전글 서머 스페셜 2019 <낭트의 자코>